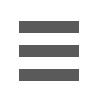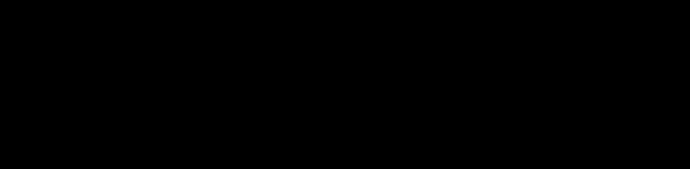검색박스
- 전체뉴스
- 뉴스센터
- 게임정보
- 오피니언
- 멀티미디어
다큐보다 사실적인 '에베레스트', 자연 앞에 선 인간의 하찮음

에베레스트 산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네팔과 중국의 경계를 이루며, 높이는 8,848m이다. 빙하에 침식되어 매우 가파르며, 여름에도 폭설이 잦다. 에베레스트란 산의 이름은 인도의 측량 국장이었던 앤드루 워의 제창으로 에베레스트 경의 측량 공적을 기려 붙여졌다. (중략)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것은 1953년 존 헌트를 대장으로 한 제4차 영국 원정대이다. 이어 스위스 대(1956년), 중국대(1960년), 미국대(1963년), 인도대(1965년), 일본대(1970년), 이탈리아 대(1973년)가 차례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도 1977년에 고상돈이 정상을 정복함으로써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나라가 되었다. - '천재 학습그림백과' 중에서 -
'거대한 자연에 맞선 도전, 그 커다란 울림'(서울신문)이나 '대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그러나 위대한 인간의 도전'처럼 멋드러진 문장으로 영화 '에베레스트'를 소개할 수도 있었지만, 영화 앞에 그리고 글 앞에서 좀 더 솔직해지기로 했다. 등반의 '등(登)'자도 모르는 한 명의 관객의 입장에서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는 중반까지 심드렁함을 감추기 힘들었다. 도대체 저들은 왜, 무엇 때문에 '에베레스트'에 오르고자 하는가?
다른 누군가의 도전 혹은 취미에 대해 나의 (편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틈만 나면 글을 써대는 나의 별스러운 짓도 누군가가 보기엔 심드렁한 일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풀 수 없는 물음이 영화를 보는 내내 반복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저들은 왜, 무엇 때문에 '에베레스트'에 오르고자 하는가?


비용(65,000달러)을 지불하면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돕는 상업 등반팀 '어드벤처 컨설턴츠' 팀의 취재를 위해 합류한 존 크라카우어(마이클 켈리)가 베이스 캠프에 모인 팀원들에게 "당신들은 도대체 왜 산에 오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옳다구나' 싶었다. 뭔가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답을 찾게 되는 것일까?
팀의 리더인 롭 홀(제이슨 클락)은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라며 뻔한 농담을 던지며 무거워질 뻔한 분위기를 살리려 하고, 남바 야스코(모리 나오코)는 "평생 7개 중 6개 최고봉에 올랐으니까 7번째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는 '목적'만 존재할 뿐 '목적 의식'은 빠져 있었다.
평소에는 목수, 집배원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한 더그 한센의 "보통 사람이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도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에서 그의 도전을 마음 속 깊이 응원하게 만드는 뜨거움이 느껴졌다. 또, "집에 있으면 내 위에 늘 먹구름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산에 오를 땐 그렇지 않다"는 벡 웨더즈(조슈 브롤린)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아내와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산에 오른다.
물론 누군가의 도전이 더 가치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에겐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할까? 세계최고봉(8,848m) 에베레스트, 귀향(歸鄕)이 허락되지 않은 목숨을 건 도전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산은 혹은 에베레스트는 그들의 이유들에 어떤 대답을 주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영화 '에베레스트'가 '인간의 도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전'을 이야기하는 만큼 그 '무모함'과 '오만함'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비춘다. 아름다운 설경(雪景)을 자랑하며 순순히 길을 내주던 에베레스트는 갑작스레 변덕을 부려 정상을 구경한 이들의 하산(下山)을 쉬이 허락치 않는다. 눈사태와 눈폭풍이 몰아닥치면서 위대한 도전은 처절한 생존으로 바뀌게 된다.
그제서야 철저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을 오르는 것이 '무모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몸 상태가 현저히 나빠진 상황에서 정상에 오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 어리석은 욕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천재 학습그림백과'의 에베레스트의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자연을 마치 '적(適)'으로 간주하고, 경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그릇된 사고방식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못된 착각이다. 영화 '에베레스트'에서 처절하리만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영하 40도의 강추위에 손발은 물론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산소 부족으로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모습은 하찮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산악인 엄홍길은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해 '정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이 정상을 잠시 빌려주는 것일 뿐 사람이 어떻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느냐. 내가 산에 올라간 것도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에베레스트'는 인간의 도전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연의 위대함도 보여준다. 거기에는 기적도 없고, 영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이 있을 뿐이다.
실화(존 크라카우어의 '희박한 공기 속으로(Into Thin Air')를 바탕으로 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영화 속에는 작위도 없고 미화도 없다. 흔히 재난영화들이 갖는 갈등 구조들이나 감동 요소들이 제거됐다.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사실감'에 집중한다. 그 사실감의 밑바탕에는 감독과 배우 등 스태프가 에베레스트 5,000m 이상을 등정해 촬영한 영상이 한몫을 단단히 했음은 영화를 직접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글 : '버락킴'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 (http://wanderingpoet.tistory.com)
* 본 리뷰는 게임포커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
|||
|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