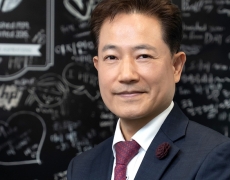'게임 기자'라는 직업을 오래 전부터 꿈꿨다.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2'를 국내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했을 때, 민간인(?)으로서 그 현장에서 봤던 게임 전문기자의 인텔리(?)한 이미지가 뇌리에 강하게 남아서였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철 없던 이유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엔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욕심이 생겼다. 좋아하는 게임도 마구 하고, 업계 사람들도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글도 열심히 쓰고 싶었던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프로그래밍과 전자기기 기술도 때려 치우고, 부모님의 강한 반대를 이겨낸 후 마침내 게임 기자가 되고 나니 왠걸, 신입이 느낀 현실은 꽤나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게임 기자 지망생을 위해 준비했다. 이제 막 첫 걸음을 시작한 신입기자만이 쓸 수 있는, 이름하여 '게임 기자 Before & After'. 기자가 되기 전과 후 바뀐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써봤다.
게임 기자라고 게임'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임 기자는 게임만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하곤 했다. 물론 기자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게임 타이틀 위주의 글을 많이 작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뭐 신작 게임 리뷰라든가, 명작 게임 추천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느낌? (출처 : DORKLY)
이런 비슷한 느낌? (출처 : DORKLY)
물론 리뷰 등의 글을 작성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지만, 주(主)는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게임'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업무상 필요한 게임은 하지만, 하루 일과를 오로지 게임만으로 채우진 않는다. 착각하지 말지어다.
게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기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만' 골라서 즐기는 '게이머'일 수 있었다면, 기자가 된 후에는 내가 싫어하는 장르의 게임'도' 해봐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나는 취향이 편협해서 액션과 핵앤슬래시, 몇몇 리듬게임과 FPS만 주로 했었다. 물론 해왔던 게임을 전부 생각해보면 이것 저것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했었지만, 좋아하는 게임과 싫어하는 게임의 구분이 확실한 편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평소 잘 하지 않던 모바일게임을 하려니 적응에 애를 먹었다.
 공포게임을 하지 못함에도 '팬심'으로 플레이 했던 '바이오쇼크' (출처 : 2k 바이오쇼크 공식 홈페이지)
공포게임을 하지 못함에도 '팬심'으로 플레이 했던 '바이오쇼크' (출처 : 2k 바이오쇼크 공식 홈페이지)
그래도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모바일게임이 가진 나름의 재미를 알게 되었고, 장르 수용력(?)이 높아졌음은 물론 게임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신작 모바일게임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즐겨 하지 않았던 장르를 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공포 게임은 못할 것 같다.
나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자가 되기 전 개인 블로그에 리뷰와 칼럼을 쓰던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글을 완성해서 올렸다는 자기만족이 더 컸다. 글을 공들여 쓰고 나면 이후에도 여러 번 글을 다시 읽어보며 계속해서 고치곤 했다.
기자의 개인 블로그에는 하루에 많아야 100여 명이 방문한다.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는 탓이다. 방문자 수의 대부분은 철 지난 게임의 공략이나 가이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글을 본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했다. 잘 봤다는 댓글이 종종 달리긴 했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썼던 허접(?) 리뷰가 '네이버' 메인에 걸려 8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온 적은 딱 한 번 있었다.
썼던 허접(?) 리뷰가 '네이버' 메인에 걸려 8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온 적은 딱 한 번 있었다.
한번은 기자가 된 후 모 게임의 리뷰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 기자 본인이 썼지만 '참 못 썼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작성하신 리뷰 잘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제야 내가 쓴 글을 보는 눈이 많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 일이 있었던 후에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글인 만큼 조심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집에서 당당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다른 가정의 사례는 잘 모르지만, 유독 보수적이셨던 부모님께서는 게임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 PC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카우방을 돌던 중 어머니께 끌려가 흠씬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컴퓨터의 케이블이 전부 잘라져 있던 적도 있다. 심지어 하도 게임을 많이 해서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는데, 당시 나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PC방으로 향했다.
 요즘도 향수에 젖어 가끔 성역을 지키기 위해 악마사냥을 떠나곤 한다. (출처 : '디아블로3' 공식 홈페이지)
요즘도 향수에 젖어 가끔 성역을 지키기 위해 악마사냥을 떠나곤 한다. (출처 : '디아블로3' 공식 홈페이지)
기자가 되기 전에도 '게임 기자'라는 이유로 심하게 반대하셨다. 왜 하필 게임이냐, 굳이 기자가 하고 싶다면 사회부나 정치부도 있고 경제부도 있지 않느냐며 만류하셨다. 이렇다 보니 늘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눈치 보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기 시작해서인지, 부모님께서 게임업계 종사자라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기자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는 등짝스매시(?)를 맞은 일이 없다. 휴일에 집에서 '오버워치'를 할 때 당당히 마이크를 쓸 수 있고, '뭐하고 있니?'라는 부모님의 물음에 '게임이요'라고 답할 수 있다.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유명 인사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다
기자가 된 후에 느낀 점은 아니지만, 게임업계의 유명 인사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바뀐 점 중 하나다. 아직 행사 취재를 많이 나가본 것은 아니지만, 국내 게임 개발사의 개발자부터 게임 캐스터, 해설자 등 몇몇 인사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
 장재호 선수는 여전히 중국 '워크래프트 3' 리그에서 활약 중이다.
장재호 선수는 여전히 중국 '워크래프트 3' 리그에서 활약 중이다.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만남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게이머 장재호 선수와 (기회가 된다면) 제프 카플란 디렉터를 만나보고 싶다. 오오, 제 5의 종족. 오오, 외계인.
기회를 잡은 운 좋은 놈, 앞으로의 기자 생활에는 어떤 일들이?
최근 나는 '다이나믹 듀오'의 '서커스'라는 곡의 가사가 참으로 와 닿아 자주 듣고 있다. 기회를 잡았으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래퍼 '도끼'의 각오가 돋보이는 곡이다. 기자는 '도끼'처럼 '기회를 잡은 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운 좋게도 반대를 무릅쓰고 소신껏 시작해 잡은 기회이다.
솔직히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기자 생활에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도 된다. '도끼'처럼 기회를 잡았으니,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